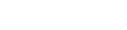이번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경제 회의가 아니었다. 그 현장은 문화가 정치와 외교보다 돋보인 무대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금관이 선물로 전달되고, CEO 서밋에는 BTS의 기조연설과 음악이 장식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서울의 치킨집에서 식사를 나눈 장면은 그 무엇보다 오래 회자됐다. 이 일련의 장면들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다. 국제사회에서 소프트파워가 하드파워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는 것. 숫자와 전략, 성명서로는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이 문화라는 언어 앞에서는 부드럽게 열렸다.


[갈라쇼 중 활약한 '산호랑나비' 드론 ⓒ APEC2025KOREA]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산호랑나비'를 영감을 얻은 나비 드론을 주제로 나눈 짧은 대화도 같은 맥락에 놓인다. 시 주석은 "만찬 장소에서 나비가 날아다녔는데 참 아름다웠다"며 "이 대통령이 제게 '내년에 나비를 이렇게 아름답게 날리실 것인가요'라고 질문해 여기의 이 아름다운 나비가(차기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의) 선전까지 날아와 노래까지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라는 화두를 던졌다. 두 사람의 대화는 한시처럼 간결했지만, 그 안에 변화와 연결의 상징이 담겨 있었다.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공식 발언보다 훨씬 부드럽고 진한 여운을 남긴 순간이었다. 이런 문화적 수사와 상징이 회담 전체의 분위기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후협상에서도 이런 소통의 언어가 있길 기대한다. 매년 열리는 회담마다 감축률, 재정 분담, 배출권 거래 같은 기술적 논의가 쏟아지지만 진전은 더디다. 각국은 책임을 놓고 대립하며, 합의문은 늘 원칙적 수준에 머문다. 과학은 정밀하고 경제는 냉정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여전히 멀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본질은 데이터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신뢰의 결이 끊겨 있는 것이다.
문화는 이 결을 다시 이어주는 힘이다. 예술과 음악, 음식과 이야기는 정치적 언어나 경제지표로는 포착되지 않는 인간의 층위를 회복시킨다. 문화는 언어의 벽을 낮추고 감정의 회로를 복원한다. 숫자와 조항이 경직시킨 회의장의 공기를 풀어주는 것도, 경쟁 구조 속에서 공감의 여지를 만드는 것도 결국 문화다. 그것은 합의의 절차가 아니라 신뢰의 토양이다.

[APEC 기간 중 큰 화제를 모았던 엔비디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리더들의 깐부치킨 회동 ⓒ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인스타그램]
다자주의가 그 기능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지금, 새로운 돌파구는 딱딱한 제도 밖에 있다. 문화는 회담과 협상의 주변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담의 방향을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바늘 역할을 한다. 회담이 끝나면 잊히는 문서 대신, 오래 남는 전시와 공연, 노래와 이야기가 협력의 기억을 이어간다. APEC에서 문화적 상징과 소통이 관계의 온도를 높였듯, 기후회담에서도 인간적인 언어가 필요하다. 그것이 서로의 결을 맞물리게 하고, 경직된 구조를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이다.
기후위기의 시대, 문화는 그 힘을 더 발산해야 한다. 문화는 협상의 틈을 따라 스며들어 관계의 결을 부드럽게 잇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 하드파워가 벽을 세운다면, 소프트파워는 그 벽 사이로 길을 낸다. 치맥과 산호랑나비가 외교와 협상의 공기를 바꿨듯, 기후외교의 새로운 언어도 그 길 위에서 시작되길 기대한다.
by 김원상(기후솔루션 언론 커뮤니케이션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