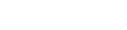테이크아웃한 커피를 플라스틱 빨대로 마시다가 문득 ‘북극곰이 멸종하면 어떡하지?’하고 생각한다. 커피 회사 로고를 볼 때마다 갖는 이런 죄책감은 무엇일까? 사람은 미안한 척을 잘하는 동물이라 마음은 안 그러면서 반성하는 척 만으로도 죄의식을 덜 수 있어서?

사진: 강봉형 작가, 디자인: ESG.ONL/ESG오늘
ESG,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를 축약한 이 용어는 요즘 사람들에게 천천히, 고통스럽게, 아마도 장황하게 어떤 도덕적 편안함과 실존적 불쾌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뉴스에서, 고깃집에서, 커피잔에 새겨진 슬로건에서 ESG라는 약어를 처음 마주쳤을 때의 그 미세한 어색함. 어쩌면 금방 잊히는 카테고리 같다는 몰이해.
서울의 여름은 생각보다 덥고, 뉴욕의 봄은 예상보다 늦게 온다. ESG라는 단어는 계절의 감각처럼 시대를 헤엄친다. 그런데 처음엔 눈길도 안 주다가 이젠 얼핏 듣기는 했지만, 정확히는 모르고, 뭔가 중요한 듯도 한데 뭔가 남 얘기 같은 이 느낌은 무엇일까. 어떤 의미로는 신문 사설처럼 읽혔다. 맞는 말인데, 좀 멀리 있달까. 이해는 되지만, 체온이 없달까.

어떤 제품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카피를 보면 반사적으로 미안해진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고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나잖아? (그러다가 금방 ‘나 하나쯤이야’ 회로가 켜지고, 나는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꽂는다. 꼭 내일부턴 정크푸드를 먹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면서, 조금 전에 먹은 감자칩을 ‘식이섬유가 들어간 자연주의 스낵’으로 재정의하는 안간힘처럼.)
그 사이 ESG는 이 시절 최고의 PR이 되었다. 적당히 해가 없고, 윤리적이고, 포장 가능하므로. 인류의 모순을 기호화한 듯한 이 용어는,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자기소개서처럼 들린다. 진심인 듯 진심이 아닌 듯 진심인 애매함이랄까. 어쩌면 자본주의가 가슴께에 “나, 이제 착해질 거야”라고 붙인 이름표 같다. 그리고 기업은 이 단어를 마케팅의 샴푸처럼 쓴다. 기름진 진실을 샅샅이 헹구는 용도로.
사무실 창문에 나비가 부딪친다. 유리에 짓이겨진 채 맹렬하게 날개를 퍼덕이며 생의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다. 유리는 하늘을 흉내 내듯 창공을 비추지만, 바람도 구름도 없다. ESG는 유리창처럼 반들거리며 시대의 윤리와 효율, 투명성과 책임을 묻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맑은 글자들의 장막 너머로 무엇을 보는지 또 보지 못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ESG는 사실 질문이되 대답하는 이는 적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물음표인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너무 커서 모두가 회피하는 의문이거나. 이 의구심에 대한 단서를 나는 2년 전, 도쿄 오모테산도 골목에서 찾았다 수십 년간 장어덮밥을 팔아온 작은 식당. 주인은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않으려고 종이 포장을 개발했다. 게다가 노숙인에게 남은 음식을 기부한다. 직원들은 전부 정규직에, 주방장은 장애인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장어덮밥 식당이 발언하지 않은 모토 자체가 ESG였다. 그때 그는 ESG를 몰랐으나 고객을 존중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존중이야말로 오래간다고 믿었다. 유행보다, 마케팅보다. 놀랍게도 그 식당 옆 옆의 식당에서는 손님이 다 먹지 못한 밥을 조심스레 싸주고 있었다. 재활 용지로 만든 종이 포장지는 고양이 모양 스탬프가 찍힌 채 “음식은 생명입니다.”라는 일본어가 쓰여 있었다. 그렇게 하라는 제도도, 그것에 관한 수치로 나온 바도 없다. 그의 하루는, 정직하게 씻은 쌀알 위에 세워진 윤리. 그 식당 사장은 다만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다. 그때 개선된 사회란 그렇게 작고 반복적인 선택들로 완성된다는 것을 다시 배웠다.
밴쿠버의 어느 밤, 불법 체류 노동자를 고용한 공장에서, 사장이 하루 일을 마친 이주노동자에게 김밥을 사주었다. 계약서에 없는 일이었고,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확신했다. 진짜 지속가능성이란 그 김밥 같은 거라고. ESG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태도라고. ESG가 진짜 근사해지는 순간은 보고서 바깥에서 왕왕 보인다. 좋은 일은 늘 조용히 시작되고, 시작은 보통 아주 사소한 신념에서 비롯된다. 빼어난 ESG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을 잘 한다. 컵을 닦고, 종이를 덜 쓰고, 약속을 지킨다. 무엇보다 자기가 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 어떤 이는 요동치는 변모를 말하고 싶어 하지만 진짜 변화는 늘 작다. 아주 작아서, 웬만해선 기사에도 실리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이 진짜라는 걸. 말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어떤 때 ESG를 외치는 사람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ESG를 이해한다고 착각한다. 일회용 컵을 거부하거나, 아마존의 현실에 혀를 차거나, 이사회의 사진 속 여성 임원들의 비율에 경악하면서도 여전히 초거대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순. 속에서 반문 하나가 꿈틀댄다. 그래서 어쩌라고? 혹시 ESG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책감을 제도화하려는 (어쩌면 유일한) 시도일까? 아니면 시대의 불안을 구체적 항목으로 정리함으로써 살아남으려는 안간힘일까?
어떤 회사는 탄소를 줄이겠다고 공언한다. 그 말은 바람 같지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내내 지켜봐야 한다. 말은 쉬우나 감시는 어려운 일. 그것이 ESG에 관심을 두는 이유이자, 정확히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실은,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 안다는 것은 행동을 뜻하기 때문에. 모두가 속으로 고백한다. 행동은 얼마나 피곤한가. 그러나 아무도 면제되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무한궤도의 트레드밀 위에서는. 어떤 때 지구는 거대한 양동이처럼 보인다. 물이 가득했던 양동이가 이제 조금씩 샌다. 누구는 구멍을 내고, 다른 이는 손가락으로 막고, 나머지는 물소리를 듣는다. ESG는 그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이다. 막는 사람. 뚫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결국 ESG는 누가 나를 보지 않아도 내가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법이다.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그냥 좋은 선택. 회계적 리스크가 아니라, 인간적 직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런 직관은 보고서에선 보이지 않지만,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는 것을.
ESG가 세계를 바꾸는 드문 도구가 될지, 그냥 보고서에 그칠지를 결정하는 건 아무래도 사람이다. 매일 저잣거리에서 지속가능성을 외친다 해도 그건 결국 사소한 것들의 연속 아닌가. 회사의 명패 뒤에 일하는 이들이 무슨 컵으로 마시는지, 컴퓨터를 끄고 퇴근하는지, 어떤 말투로 회의를 시작하는지. 대규모의 선언이나 장엄한 사례나 송두리째 뒤엎겠다는 야심이 아니라, 단지 그게 더 좋다고 믿는 습관, 누군가의 조용한 선택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꿀 것이다.
커피를 마시고 컵을 씻는 몸짓, 이메일에 친절한 인사를 붙이는 마음, 자신이 만든 물건에 책임을 갖는 의식처럼 때로 측정되지 않는 방식에 영원성이 깃든다. 오래된 목재처럼, 쓰면 쓸수록 더 단단해지는 관계처럼. 가끔 그 정도면 충분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엔 애초에 완벽한 구조 같은 건 없으니. 그래도 누군가는 매일 나무를 심고 있다. 나무를 꼭 숲에만 심는 것도 아니다. 때로 사무실 책상 밑에도 무언가는 조용히 자란다.

언젠가 ESG가 이야기로 남았으면 좋겠다. 회장의 인터뷰가 아니라, 공장노동자의 일기에서. 브랜드의 광고 카피가 아니라, 바닷가를 청소하는 노인의 손길에서. 그것이야말로 아무 보상 없는 손짓이자 가장 순수한 형태의 ESG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질문 하나가 남았다. 당신의 ESG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유리처럼 반짝이고 있나? 아니면 흙먼지로 지저분해졌으나 싱싱하게 살아있나? 또 어떤 냄새가 날까? 종이 냄새? 잉크 냄새? 아니면 막 구운 빵 같은 따뜻한 냄새? 세상은 거짓말로 채워져 있지만 단 한 명이 진실을 말하면, 건조한 공기가 잠깐 촉촉해질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나도 단 한 명이 될 수 있을까? 당신도 그럴 수 있을까?
by 이충걸(에세이스트, 전 GQ코리아 편집장)